[슈퍼우먼은 못 하겠다] 11. 아기가 언제 어디서 다쳤는지 모르겠다(22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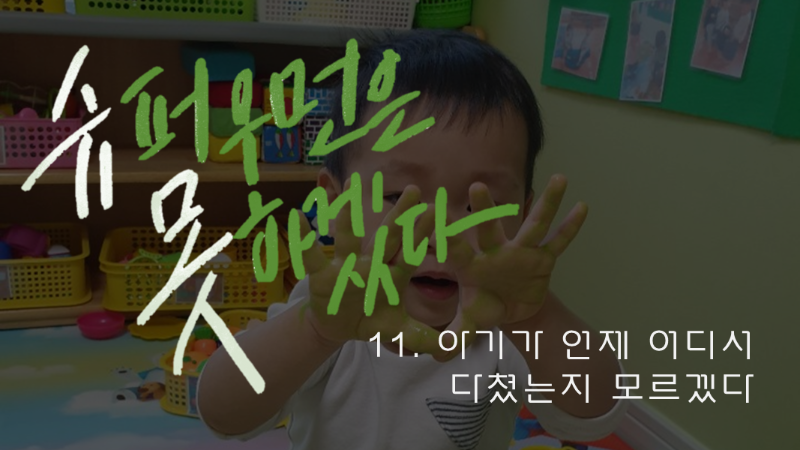
“어머님, 노아 볼 쪽에 상처가 하나 나 있네요. 담임선생님 말씀으로는 올 때부터 있었다고 하시는데~ 아셨어요?”
오늘도 육아시간을 쓰고 부랴부랴 달려 어린이집에서 하원시키는데 원장선생님이 이야기하신다. 볼과 턱 사이 어드메에 제법 길게 긁힌 상처다. 나는 아침에 해도 뜨기 전에 일어나 출근한다. 아가가 깰까봐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등원을 맡아 하는 남편에게 들은 바도 없다. 뭐, 긁히고 다치는 게 처음도 아니고. 나랑 놀다가도 여기 쿵 저기 콕 많이 부딪히고 다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요? 어, 어디서 다쳤지? 에고, 다칠 수 있죠 뭐~”
“어머님 모르셨구나. 하하. 아버님이 아실 수도 있겠네~ 어디 오면서 뾰족한 데 긁혔었나 봐요? 약은 발라줬는데. 집에서도 약 좀 발라주세요. 어머님~”
“네~”
쿨한척 대답은 하고 나와서, 남편에게 전화해보니 모른단다. 기분이 쎄하다. 뭐 아기가 다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등원 길에 있었던 일인지, 간밤에 자다 긁힌 건지, 어린이집에서 있었는지 모르겠다. 아기가 언제 어디서 다친 건지 모른다는 게 꽤나 기분이 이상해진다.
. . .
며칠 전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많이들 아기는 다치고 아프면서 큰다고 한다. 얼마 전 노아도 감기에 걸려서 열이 꽤나 올랐고, 열이 내리고도 콧물이 심했던 적도 있었다. 남편이 가정보육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 그래도 아주 다행이었다. 내가 출근할 때 차를 끌고 다니기에 퇴근 후 달려와 아기 병원에 들렀다가 아무래도 상태가 좋지 않아 다음 날도 가정보육시키겠다고 원장님께 전화를 드렸드랬다. 옷은, 음식은, 약은, … 아기를 어떻게 챙기면 좋을지 원장님께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통화는 “어머님이 신경 좀 쓰세요~”라는 원장님의 말로 마무리지어졌다.
?????
헐.
뭐야 뭐야. 뭔데.
나 아기한테 신경 안 쓰는 것 같나. 출근하는 엄마라 좀 관심이 없어보이나. 요즘 육아시간을 빠듯하게 못 쓸 때도 많아서 등하원을 거의 남편이 해서 그런가. 알림장에 한 마디 인사도 안 적은지 오래 되어 그런가. 자고 나면 머리가 뜨는 아가가 맨날 까치집 머리를 하고 등원을 해서 그런가. 아가가 아프든, 안 아프든. 나는 내 하루 체력을 다 걸고 아기를 신경 쓰고 있는데.
아닌가. 그냥 별 뜻 없는 말인가. 아가 아파서 고생하겠다는 말을 저렇게 하신 건가. 말 하나하나에 의미부여하면 안 되는 거려나.
. . .
볼이 긁힌 아가의 상처를 보면서도, 그냥 내가 모르는 집에서의 실수가 있었으려니 생각했다. 내가 아기의 모습을 다 볼 수 없으니까. 행여 어린이집에서 다쳤대도 뭐. 이미 아기는 다쳤고, 어린이집에서는 모른다고 하고 이미 돌아나왔는데. 다시 되물어서 뭐하나 싶다. 앞으로 아침 등원 전 아가 몸을 잘 살펴달라고 남편에게 당부할 수밖에. 그래도 노아 피부는 쌩쌩하니까 금방 새살 돋겠지. 저녁에는 아기 잠자리와 노는 공간, 가방과 겉옷에 긁힐만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약을 발라주었다.
그런데 다음날,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평소처럼 아가는 이 장난감, 저 물건을 누비며 놀고 다니다가 제법 밤이 깊어 지고 있었다. 남편과 나는 적당히 거실에 앉아 쉬고 있었던가.
이건 또 뭐야.
아기 손을 보는데 갑자기 또 못 보던 상처가 있다.

헐.
이건 화상이다. 화상이야.
화상은 찬 물에!!
아, 근데 그건 응급조치인데.
이미 이정도 된 거면 응급조치 타이밍은 지나간 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야하지?
비판*? 리도맥*?
평소에 노아에게 바르던 이것들은 화상 연고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근데 어디서 다친 거지?
언제 다친 거지?
저녁에 다칠만한 일이 있었나?
이 정도면 꽤나 아팠을 거 같은데.
아가는 왜 울지도 않았지.
어, 운게 아니면 집에서 다친게 아닌 건가.
많은 생각들이 훅훅 지나간다. 냉큼 사진 찍어 어린이집에서 아시는 상처냐고 여쭈니 모르신단다. 뜨거운 것 만질 일 자체가 없다고 하시니, 알겠다고 말씀드려 전화를 끊었다. 어린이집에서 보내주신 사진에도 손바닥에는 아무 일이 없어 보인다. 그럼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일인 건가.
노아는 엄마 아빠가 “아파?” “아뜨?” 물어보니 그제서야 자기 손에 상처가 있고, 이게 ‘아파’의 흔적, ‘아 뜨’거운 것을 만진 흔적임을 안 듯하다. “아뜨 어디서 했어?” 물으니 지난주에 식빵을 구워먹다가 뜨거운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지금은 콘센트가 꽂혀있지도 않은 토스트기를 가리킨다.
아, 이 아이도 어디서 다쳤는지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구나.
그만큼 안 아프다는 건가?
인터넷을 검색하니 화상은 화상 전문으로 가라느니, 보이는 것과 달라서 상처가 오래 갈 수 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아, 밤이 늦어서 병원은 내일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아가가 지금 당장 눈 앞에서 화상을 입었거나 아파한다면 응급실에라도 달려갔을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 다친 건지 모르니 막막하다.
갑자기 정신이 바사삭, 탈탈탈. 제대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다. 아니, 너무 많은 생각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삐걱댄다. 노아는 주의를 주고 나면 오히려 약간 겁을 먹어서 걱정이었지, 위험한 것들은 알아서 피하는 편이라 내가 그렇게 꼼꼼하게 위험한 것을 차단하진 않아왔었다.
오늘도 내가 어떤 실수를 했던가?
근데 오늘 식사 당번은 남편이었는데.
꼼꼼한 남편이 그렇게 실수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뭐지?
누구지?
어디지?
왜지?
막상 아가는 엄마 아빠가 묻지 않으면 상처의 존재도 잊은 채 즐겁게 놀고 있다. 아픈 줄도 몰랐던 아가를 보며 눈물이 왈칵 난다.
너가 언제 어디서 다쳤는지 내가 모르다니.
아픈 게 아픈 줄도 잘 모르는 아가인데.
엄마가 봐줬어야 했는데. 아픈 거 뜨거운 거 알려줬어야 했는데.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울다가, 걱정했다가. 괜히 짠해서 아가한테 안아달라고 졸라서 토닥토닥.
마음이 진정이 안 되어 맘카페에 이런 상처 어떻게 하셨었는지 묻고 댓글을 보며 겨우 마음을 달랜다.
. . .
다행히 다음날 병원에서는 약만 바르면 되는 상처라고, 새 살 돋으며 자연히 떨어져 나갈 정도라고 한다. 며칠이 더 지난 지금은 얼굴에 긁힌 상처도, 손에 화상 상처에도 제법 새 살이 돋고 있다. 뜨거운 물건은 우리 어른도, 노아도 서로 더 조심하고 있다.
아가는 다치기도 하면서, 엄마는 미안함에 울기도 하면서 이렇게 둘 다 배우고 크는 건가 보다. 여전히 어디서, 언제 다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과거에 자책하며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여기 노아의 눈을 한 번 더 바라봐주는 것이 더 낫겠지. 그래도 한 번 다치니 심장이 너무 벌렁벌렁하잖아.아프지 말자, 우리.
(흐음, 근데 이상하다. 남편은 속상해하긴 했어도 미안해하진 않는다. 나는 또렷한 내 잘못이 아닌데도, 아가를 다 보고 알지 못했다는 것이 왜이렇게 미안할까. 당연히 내가 다 보고 알 수 없는 걸 아는데도. 이왜 남편과 나는 다르게 생각할까. 신기하다 신기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