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을 땐 돌도 씹어먹는다? 그러다 죽습니다.
나는 앞으로 내가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말하지 않기로 했다. 쌈장과 흰쌀밥 만으로 버티는 고시생과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을 냉동실에 넣어두고 때마다 녹여먹는 20대 알바생 이야기를 읽었다.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읽었음에도 현실감이 없어 다시 문단의 처음으로 돌아오기를 수 차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문제가 청춘들의 보편적 현실임을 실감했다.
<청년 흙밥 보고서>를 쓴 시사IN 변진경 기자는 오랫동안 청년 이슈에 주목해왔다. 변 기자는 2008년부터 청년들의 주거, 고용, 인권, 밥을 주제로 기사를 썼는데 과거에 썼던 기사의 작성 날짜를 현재로 바꾸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청년의 삶이 고되다고 말한다. 그런데 하고 많은 청년 주제 중 왜 하필이면 '밥'이 책의 중심에 섰을까? 청년의 식사 모습은 지금 그들이 어떤 삶을 겪어내고 있는지 말해준다.
만약 청년과 밥의 조합이 탐탁지 않게 느껴진다면, 돌도 씹어먹을 나이에 무슨 먹는 걸로 호들갑이냐는 마음이 인다면 이 책을 한 챕터만이라도 읽어봐야 한다. 무심코 지나친 주변 청년들이 새롭게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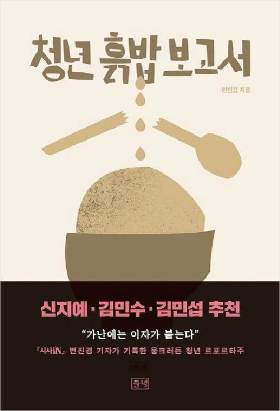
ⓒ들녘
눈물 젖은 밥을 먹어보지 않은 자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젊음이 더 이상 특권이 아닌 '착취의 명분'이 돼버린 우리 사회에서 흙수저 청년들의 밥상을 꼭 한번 조명해보고 싶었다. 성공과 미래를 위한 '임시 정거장'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빛나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해야 할 청춘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그대들은 충분히 먹을 자격이 있다고, 그걸 빼앗은 사회에서 다시 돌려받을 방법을 궁리해 보자고. -p.24-"
청년들은 돈이 궁하면 식비를 줄인다. 교통비와 통신비는 최소한의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 과정을 이어가기 위해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젊은 게 한 밑천이라며 편의점 김밥과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거나, 정 돈이 없으면 굶는다. 흙밥을 먹지 않으려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돈이 쪼들리는 청년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데, 이상하게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는 제대로 밥을 챙겨 먹을 수 없다.
아르바이트 생들은 식사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제때에 양질의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니 건강이 나빠진다. 그뿐인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시간을 뺏기고 기력을 소진해, 취업준비가 충분치 못하다. 가난은 고리대금업자의 이자처럼 삶을 지속적으로 피폐하게 만든다. 가난 -> 아르바이트 -> 시간 부족 -> 학업 및 취업준비 부족 -> 취업 실패 -> 가난의 악순환은 장기 불황과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흰쌀밥에 카레가루만 풀어 끓여먹고, 밥 한 숟갈에 소금 후추 뿌려 먹는 이야기가 웃기고 슬픈 추억으로 회자된다. 5000원과 햇반 한 개로 세끼를 해결하는 방법이 취준생 생존 꿀팁으로 파다하게 퍼지는 세상이다. 그러나 청년은 약자 또는 취약계층으로 쉽게 분류되지 않는다. 장애인, 노인, 어린이 현안도 산적해있는데 혈기왕성한 청년까지 세금으로 챙겨야 하느냐는 세간의 인식이 강하다.
2016년 8월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 2831명에게 청년수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명백한 포퓰리즘 복지사업(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위험한 발상이고, 청년들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 같은 존재(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최대 6개월 간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수당은 첫 달만 입금되었다.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행보를 가로막았기 때문이었다.
청년수당 정책은 우여곡절 끝에 2017년 7월부터 만 19-29세의 서울시에 거주하는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 5000여 명에게 50만 원씩 6개월 간 지급되었다. 젊었을 때부터 공돈 받아쓰는 습관이 들 소지가 많은 정책이라는 우려와 달리 수당을 받은 청년들은 자기 진로 계획에 따라 수당을 합리적으로 활용했다. 수당 만족도가 무척 높았는데 눈에 띄는 건 식사메뉴의 변화였다.
편의점 도시락이 일반 식당의 백반으로, 봉구스밥버거가 뼈해장국과 순대국밥으로 바뀌었다. 가격으로 치면 한 끼 2000원 내외의 차이에 불과한데 이 금액이 '삶의 질' 변화를 이끌어냈다. 괜찮은 식사는 내가 이 사회에서 꽤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밥 먹는 행위 하나가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구직활동 의지를 북돋아주었다.
스스로를 존엄하게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밥상, 10년 뒤에는 가능할까.
라면에 달걀을 넣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청년 수당 수혜자의 소감을 읽다 말고 책을 잠시 덮었다. 하늘에 대고 감사의 기도라도 올리고 싶었다. 책에 소개된 청춘들에게 우월감을 느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난하다고 간주했던 내 삶의 조건들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것인지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었다. 미안하게도 나는 흙밥을 먹어본 경험이 없었다.
교대를 나왔기에 등록금이 저렴한 편이었지만 졸업하는 내내 부모님께서 학비를 내주셨고, 용돈과 방세도 타 썼다. 대학교 4학년 2학기에 치른 임용 고시에 합격하고 졸업과 동시에 발령을 받았다. 밥 고생이라 해봐야 스물네 살 넘겨 간 군대에서 짬밥이 입맛에 맞지 않다고 투정 부린 게 다였다. 돌이켜보면 정말이지 엄청나게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
내가 가르치는 반 아이들 중 유독 학교 급식을 많이 먹는 친구가 있다. 먹는 걸 사랑하는 탓도 있지만 집에서 제대로 된 아침,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없어 억지로 욱여넣는다. 나는 이 아이를 보며 급식이 없는 긴 겨울 방학을 걱정했다. 그런데 '청년 흙밥 보고서'를 접하고 나서는 아이의 20대가 염려되었다.
어린이는 자라서 청년이 된다. 지금의 제자들이 청년이 될 무렵에는 취업 의지가 있는 누구라도 청년수당을 받아 라면 대신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을까, 어려운 가정에서 큰 가난한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을까. 10년 전에 취재한 청춘의 그림자가 오늘날에도 여전해서 가슴 아프다는 저자의 문장이 계속 눈에 밟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