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을인권하다]두번째 이야기, 6월 10일

요즈음, 6학년 학생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수업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교과서 속의 순서를 따라가기도 하지만,
의미있는 '날짜'들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도 하지요.
다음주 월요일, 6월 10일에는 6.10 민주항쟁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생각이냐고요?
아래의 이야기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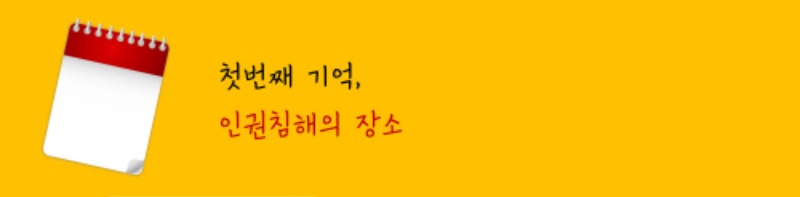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이 문장만큼 아프면서도 우스운 문장이 있을까 싶습니다.
바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벌어진 고문과 죽음에 관한 문장입니다.
남영동, 지하철역에 인접해있는 이 공간은 1987년 6월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간다는 이 곳,
뱅글뱅글 돌아가는 나선형 계단을 눈가리고 따라 올라가다보면
방향감각과 높이감을 상실하게 되는 이 곳,
고문에 못견뎌 투신하여 삶을 마감할지도 모른다 하여,
사람의 몸이 통과하지 못할만큼 아주 좁다랗게 낸 창문이 있는 이 곳,
도망가지 못하도록 방인지, 출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철제 문들이 지그재그로 나있어
각각의 방에 누가 있는지 볼 수 없게 디자인된 이 곳.
이 곳은 우리의 현대사 속에 아프게 자리잡고 있는 인권침해의 현장입니다.

민주주의는 인권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는, 모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민주주의는
모든 이의 존엄과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역사는 '인권'의 눈으로 다시 해석하고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이제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인권침해의 상징과도 같았던 장소에서 이제는 인권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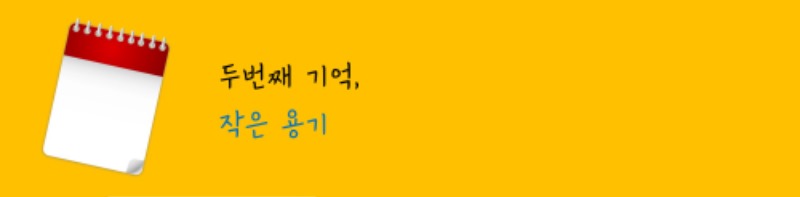
작년 초, <1987>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 몇 개 있었지요.
검사가 화장 명령서에 도장 찍기를 거부하는 장면,
의사가 화장실에서 몰래 기자에게 당시의 정황을 얘기해주는 장면,
위에서 내려온 보도지침을 확 지워버리는 장면,
그리고 '통할 구멍이 없을만큼 깐깐'하다는 교도소 경비대장이
해직기자에게 사실을 알려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아보이는 이 작은 행동들,
그리고 어쩌면 완전히 100% 순수(?)하지만은 않을 수 있는 그들의 행동이하나하나 모이고 켜켜이 쌓여서 6월항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작은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한열 열사나 박종철 열사처럼 역사에 이름이 길이 남는,
그런 위대하고 대단한, 큰 용기를 내지는 못하더라도,덜덜 떨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용기를 낼 때,
그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바위처럼 단단해보이는 세상을 바꿔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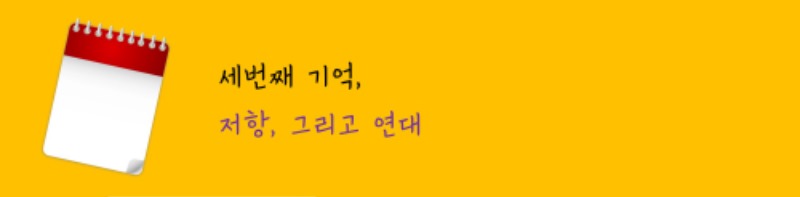
"학생들이 앞장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쳤습니다.
택시기사들은 경적을 울렸습니다.
어머니들은 총과 방패에 꽃을 달았습다.
여고생들은 자신의 도시락을 철제문 사이로 건네주었습니다.
상인들은 음료와 생필품을 보내왔습니다.
회사원들은 군중을 향해 꽃과 휴지를 던져 응원했습니다.
언론 출판인들은 진실을 왜곡하는 보도지침을 폭로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잔업을 끝내고 나와 철야 시위와 밤샘 농성에 함께 했습니다.
학생, 시민, 노동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가진 것을 나누며 자신의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6월민주항쟁 기념식 연설 중에서)
예나 지금이나, 인권은 '저항'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저항하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인권의 지평은 확장되었으며,
더 많은 이들이 권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6월민주항쟁의 의미 역시,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나타난 시민들의 '연대' 속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 우리에게 필요한 저항과 연대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얘기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내 교실에서부터 인권의 지평을 넓혀가볼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