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이 하이킥] Ep1. 찾아가든 떠밀려가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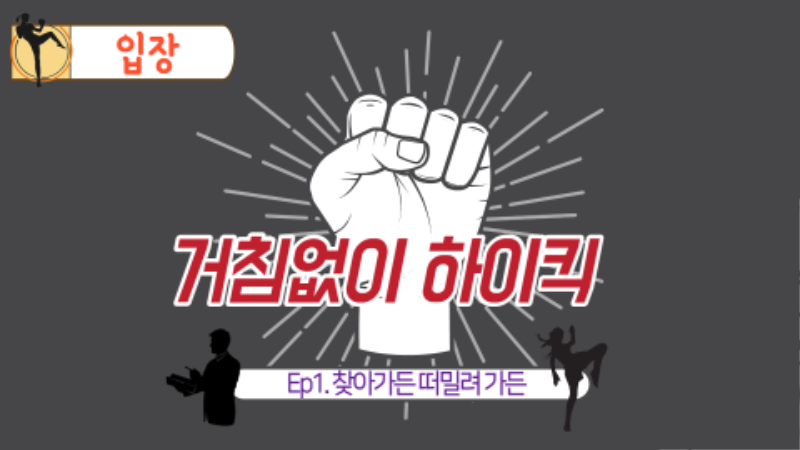
“홍코너! 신장 170cm! 몸무게 70kg! 주특기는 바디-훅 콤비네이션!
큰 환호 부탁드립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새까만 체육관에서 혼자 빛나는 링을 향한다. 내가 어쩌다 여기를 걷고 있는 걸까? 마치 가상현실에 있는 것처럼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내 이름이 울려 퍼졌다. 로프를 넘어 링에 서니 미처 보지 못한 수많은 관중들이 보인다. 두근대는 심장 소리가 내 귀까지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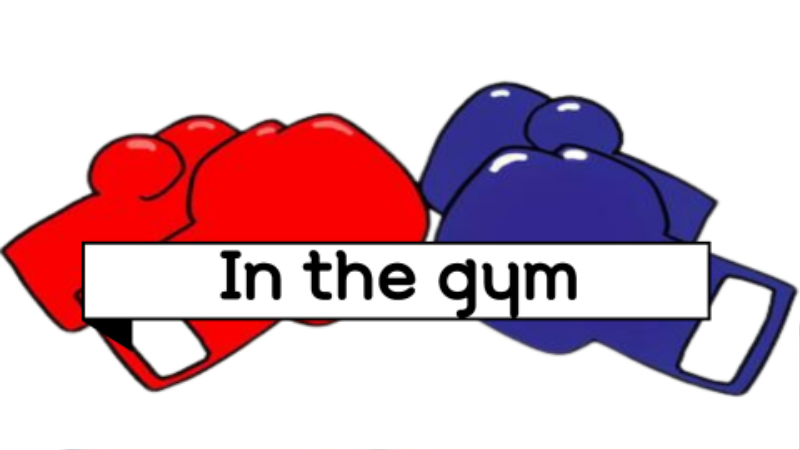
5년 전, 나는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다.
‘이제 딸내미도 어느 정도 컸으니 운동할 걸 찾아보자!’
이사와 동시에 육아를 위해 접었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헬스? 오래 해서 지겨웠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된다. 크로스핏? 재미있고 시간도 적절한데 하는 곳이 없다. 댄스? 이제 춤추고 싶은 나이는 지난 것 같다.
‘복싱이나 해야겠다!’
이사 오기 전에 잠시 했던 복싱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기초만 하느라 지겨웠지만 격투 스포츠가 하고 싶었다. 동네의 복싱 체육관을 찾아 전화를 걸었다.
“몇 시까지 하시나요?”
“9시까지 합니다.”
“아…..”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아이를 재우고 운동을 갈 생각이기에 늦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아쉽지만 우리 따님이 8시 이전에 잘 리가 없다. 혹시나 싶어 동네를 걸었다. 신도시답게 깨끗하고 새것 티 나는 간판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보자, 검…도… 저긴 헬스장이고, 저긴……”
낯선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집 앞 길 건너 2층이었다. 맞은편 스타벅스에 앉아 멍 때릴 때 봤을 법한데 기억에 없다. 평소에 1층의 가게들만 이용해서 볼 일이 없는 곳이었다.
“무에타이, 킥복싱?”

갑자기 아주 오래전에 봤었던 영화 ‘옹박’이 떠올랐다.

“어, 음…… 올라나 가볼까?”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안고 2층으로 올라갔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내부는 예상과 달리 밝고 넓었다. 꽤 많은 샌드백들이 창가에 걸려 있었고 커다란 링이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다. 장치와 시멘트가 노출된 천장은 유행하는 인테리어인가 싶었고, 전면 거울은 깨끗했다. 사다리를 놓고 천장에 무언가 열심히 박고 계시던 분이 내려왔다. 관장님이었다. 부리부리한 눈, 다부진 상체, 다소 큰 얼굴, 우리나라 인종을 남방계 / 북방계로 나눌 때 남방계의 프로토타입일 것 같은 모습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아오셨어요! 다음 주 오픈인데요. 반갑습니다!”
“아, 그냥 지나가다가 한 번 와 봤어요.”
“잘 오셨어요! 운동은 좀 해보셨어요?”
“아, 그게……”
넉살 좋은 관장님의 기에 빨려 들어갔다. 가격도 그다지 비싸지 않았다.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괜찮을까요?”
“아이고, 그럼요. 무에타이는 운동량이 많고 신체 능력도 엄청나게 향상됩니다. 초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쉬워서 여성분들도 많이 하시는 걸요!”
정신을 차려보니 입관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있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뵐게요! 글러브랑 핸드랩도 그때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때 올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얼떨결에 나는 무에타이에 발을 디뎠다. 맹세코 단 한 번도 옹박을 꿈꾼 적이 없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떠밀려 들어와 있었다.

우리는 어쩌다 교사가 되었을까?
백 명의 교사에게는 백 개의 계기가 있다. 물론 교대 면접 때야 모두가 교직에 대한 찬양과 성직자적인 교직관을 말했겠지만, 그걸 100% 믿는 면접관도, 100% 믿는다고 생각하는 응시생도 없다. 어떤 이는 GTO를 꿈꾸며, 어떤 이는 존경했던 교사의 그림자를 따라, 어떤 이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 어떤 이는 워라벨을 찾아, 어떤 이는 수능 성적에 맞춰 교사가 된다.
많은 교생들과 교대 진학 희망 고교생들을 만났다. 그들의 반짝이는 눈과 옹골찬 결의를 보며, 이미 익숙해진 교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성도 했다.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교사가 되는지보다, 어떤 교사가 되어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스러운 마음으로 왔든, 타의로 왔든 교단에 서는 순간 이미 교사다. 그리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므로 큰 책임이 따른다. 그러므로 현장에 던져진 교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교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세상의 불공평한 편견과 과도한 요구를 버텨야 하고, 박봉에 좌절한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난감해하고, 매너리즘과 맞서 싸워야 한다. 참 어렵다. 하지만 불공평한 것 같아도 동기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 GTO를 찾아 들어왔다가 월급 루팡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순간순간 교사로서의 내 모습을 선택해야 한다. 그게 어렵다면? 냉정하지만 다른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무에타이에 ‘무’ 자도 관심 없던 나는 이 길에 발을 딛었고, 5년째 즐기고 있다. 재미없거나, 가치 없다고 판단했다면 그만뒀을 것이다. 하지만 즐겁기에 어렵지만 계속하고 있다. 교직도 마찬가지다.
‘갈수록 교사하기 어려워져.’
‘요새는 학부모가 갑이고, 교사가 을이야.’
‘연금도 줄어들고, 이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
공감한다. 그리고 묻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어떤 모습의 교사가 되고 싶은지, 혹은 다른 길을 찾을지.
‘길은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드라마 ‘미생’의 대사처럼, 교사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한 인간으로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선택하려 한다. 교직의 첫 문을 열 때의 마음이 언제나 일관될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은 버린 채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