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잡설 #5. 커피
사람은 사는 이상 무언가를 마신다.
많은 사람에게 추억을 선사해주는 커피.
이게 오늘의 이야기다.

내가 처음 커피를 접하게 된 것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금이야 아메리카노가 커피하면 떠오르는 것이지만 예전에 우리에게 익숙한 커피는 이른바 다방 커피였다.

이게 내가 기억하는 커피다. (더 옛날에는 계란 노른자 띄우는 것도 있었다고 하던데 난 글로만 봤다.)
그리고 사실 이 커피에 대해서는 추억이 조금 더 있는데 어릴 때 어머니는 그 추운날에도 나를 데리고 여기저기 버스를 타고 다녔다. 꽤 추워서 나는 가기 싫어했지만 집에는 혼자 있을 수 없으니 빨간 털모자를 쓰고 열심히 따라다닌 거 같다. 여기내리고 저기 내리고 하면 어느 공장으로 꼭 들어 갔고 공장에서는 커피를 마시전 아저씨가 왜 이렇게 커피맛이 없냐고 어머니께 꼭 뭐라 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아무말 없이 그냥 커피만 교체하고는 했었다.

이 커피자판기에 냉커피 기능이 있는 걸 본 것은 내 기억으로는 90년대 중반 이후다. 그전까지는 여름에도 뜨거운 커피를 마셔야 했다.
학교에서 하드보드지 공예를 한 적이 있는데 작게 만들고 재단하는 게 귀찮아서 가로세로높이 전부 30cm정도로 재단해서 상자를 만든 적이 있다. 어머니는 그걸 자판기 돈통으로 사용하셨다. 그 돈통은 종종 내가 허락도 받기도 하고 몰래몰래 내 용돈상자로 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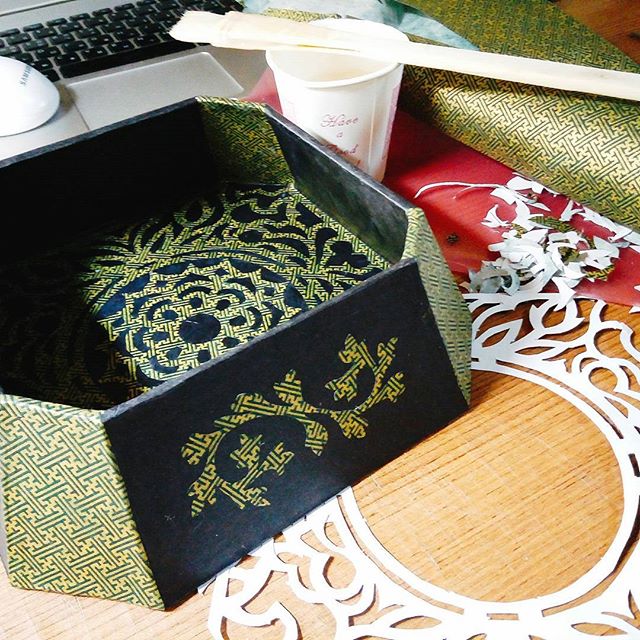
나는 공부를 남들보다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중학교를 입학하면서 대부분 새벽 2시 이전에 잠든 적이 없다. 학교갔다가 학원을 다녀와서 숙제와 문제집을 풀고 새벽한두시부터는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다가 새벽여섯시면 일어나서 회화학원을 가고 학교를 갔다. 그러다 시험기간이 되면 학원도 가지 않고 혼자 공브를 2주 넘게 했는데 너무나도 졸려서 중간중간에 커피를 타서 벌컥벌컥 마셨다. 당시는 현재처럼 믹스봉지커피가 있던 시절이 아니라서 1리터 들이 통에 커피를 타서 마셨는데 커피/프림/설탕의 황금비율이 2:2:2라고 들었지만 내가 타면 왠지 맛이 없었다. (가끔 엄마가 탄 커피를 마셔보면 꽤 맛났는데 말이다.)
밤을 새지 않기 위해서 커피를 들이 마셨으나 마시고 배가 불러서 꼭 30분 이내에 잠들었다.

고3때 학교자판기가 생겼는데 자판기의 커피는 친구들과 저녁 먹고 수다떨기 좋았으며 고2말부터 다니기 시작한 독서실의 커피는 꽤 맛났다. 독서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고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알게 된 여학생들과의 수다는 고3에게는 단비같았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시험을 볼 때 정말 신기하게도(웃기게도) 교대1학년은 1,2교시에 2학년은 3,4교시 이런 식으로 시험을 봤다. 그래서 1,2학년때는 날을 새서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 형식이 잦았는데 나는 오히려 이게 참 편했다. 대신 이때는 밤새 커피를 마시고 시험보기 전에는 바카스를 사서 마시며 막상 시험시간에는 좀비처럼 시험을 봤다.

대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을 뵈러 미국에 갔을 때 아버지 일하는 걸 하루 종일 따라다닌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차에 두고 마시는 커피잔은 콜라컵에 마시는 커피였다. 당시 한국에는 헤이즐넛향 커피라는 게 처음 등장하고 있었을 때인데 저 밍숭밍숭하고 달지도 않은 저 커피를 왜 마시는지 이해가 안되던 시절이었다.
"아빠./ 이거 무슨 맛으로 먹어요?"
"어? 운전하다 보면 피곤하니까 그냥 조금씩 마셔~ 마시다 보면 배부르더라."
"아.. 맛이나 향이나 다 별론데.."
그리고 커피를 내리는 방법 중에는 참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게 있어 제일 신기한 커피추출 방법은 사이펀을 이용한거다. 처음 건담시드라는 애니에서 본 건데 실물을 보니 너무도 신기했다.

<무려 시험관으로 커피를 내리다니 말이다.>
교사가 되고 커피는 동학년 협의 시간의 일상이기도 했다. 서로 모여서 커피를 마시며 학교 이야기도 하고 교실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많이 배웠다. 학습을 한 게 아니라 선배들의 이야기와 내 고충을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많이 배웠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게 참 신기했다.

(이런 식의 티타임이면 참 좋겠지만.... 그냥 커피한잔두고... 현실적인 티타임의 모습을 검색하려고 동학년 티타임이라 검색했더니 뭔 이래 이쁜 사람들만 잔뜩 나온다냐...)
Public agent를 끝내고 복직했던 어느날이다. 논문을 쓰느라 옆으로 많이 컸던 나는 사촌형이 주선한 소개팅을 하게 되었다. 소개팅자리에는 형수님이 나와계셨고 나만큼이나 옆으로 컸던 여자가 한명 있었다.
형수님이 가시고 그 여자는 나에게 몇가지 질문을 했다.(그 사람은 유치원 교사였다.)
"얼마 벌어요.?"
"어차피 초등학교 교사랑 만날거 아니에요? 교사 만나세요."
라고 하며 우리는 10분만에 헤어졌다. 돌아오는 차안에서 겁나 짜증나서 형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형이 바로 전화가 왔고 위로한다면서 하는 말이
"괜찮아. 나는 여자가 보자마자 나간 적도 있어." 라고 이야기 하길래 외쳤다.
"도대체 우리집안 왜 이래~!!!!"
몸이 한참 불고 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선 커피를 바꿔야 했다.
그전까지 내가 마시던 커피는 대충 이런 거였다.
'마끼아또, 프라푸치노' 등 뭔가 들으면 이탈리아틱한 이름들. 혹은 달달할 것 같은 이름들의 커피들만 주구장창 마셨었는데 이것들의 칼로리를 본 순간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바꿔버렸다.

교직에 들어선지 10년이 넘어서면서 몇가지 변화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회식 문화인데 그전까지는 1차 밥과 술, 2차 안주와 술, 3차 노래방, 4차 술.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 그러다가 점점 1차. 밥과 술, 2차 커피숍 혹은 2차 안주와 술. 3차 커피숍인 경우가 종종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개인적으로는 달갑다.
커피는 어느 순간 한국인들에게 뗄레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아마도 어느 순간에는 커피를 대체하는 게 있겠지만 그전까지는 커피가 국민음료를 차지할 것 같다.
그 누구에게나 커피에 얽힌 추억은 하나씩 있을 거다. 나에게 커피에 대한 추억은 위와 같다.

닮아 보이겠지만 동일인물은 아니다.
Maybe you think they are same people but you are wr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