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마음, 학부모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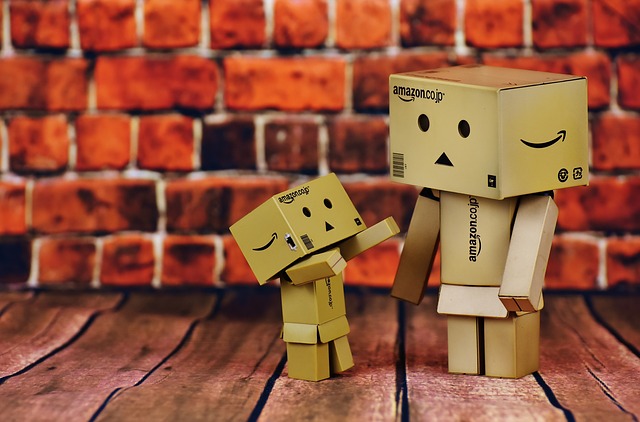
엄마와 함께 살던 시절, 아침이면 부엌에서 들려오는 도마와 칼 소리가 좋았다. 방 문 틈새로 흘러 들어오는 밥 냄새도, 지글지글 찌개 소리도 좋았다.
‘엄마 지금 밥 하고 있구나.’ 아침을 깨우는 건 엄마 목소리가 아니라 밥 짓는 소리였다.
엄마는 요리를 참 잘 하셨다. 아침에 한 번도 밥을 안 차려 주신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없었다.
엄마가 밥 해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엄마가 되고 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매일 아침 공복으로 출근한다. 애들도 아침을 거르고 어린이집으로 간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렵다. 아이가 없을 때 살던대로 지내려 한다.
‘나도 굶고 너도 굶자.’
참 무책임한 엄마다. 내 엄마는 새벽잠을 줄이면서 아침을 해줬는데…….
엄마가 아침밥을 항상 차려주셨다는 건 정성을 쏟았다는 거다. 하루도 빠짐없이 밥을 해주셨다는 건 한결같았다는 것이고. 다양한 요리를 해주셨다는 건 엄마가 꽤 창의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엄마는 주부로서, 엄마로서 자신의 일을 잘 하신 것이다.
나는 늘 그런 엄마에게 배운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공부해서 교사가 되었고, 내가 스스로 자라 어른이 됐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나에게 해준 건 밥 해준 일, 돈 벌어 키워준 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나도 이제 엄마의 자리에 앉았다. 엄마의 자리에 앉아 보니 아이들 먹이고 키우는 일이 쉽지 않다. 둘째 딸아이가 또래에 비해 작은 편인데 가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나 아이를 꼭 안고 등을 쓰다듬을 때,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첫째 아이는 휴직을 하며 키워 이유식도 정성껏 만들어 먹이고, 간식도 잘 챙겼다. 둘째는 그러지 못했다. 휴가가 끝나기 일주일 전부터, 90일이 채 되기도 전에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다. 어린이집 선생님과 내가 반반씩 아이를 키운 셈이다.
직장생활 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 아이가 없을 때 하지 않았던 일들을 내 삶에 더해야 한다. 그래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고, 습관이 되기까지 견디는 시간도 필요하다.
아이에게는 항상 미안하다. 너무 어린 아이를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 몸집이 작은 건 아닌지, 중요한 시기에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이를 보낸다.
나에게 아이를 맡긴 부모님도 아이를 보면 이런 마음일 거다.
‘너에겐 항상 부족하다. 미안해.’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은 항상 애잔하다. 아이가 안 하던 말과 행동을 할 때면 너무 예쁘고 기쁜데 눈물도 난다. 웃음과 눈물이 함께 맺힌다. 함께 해주지 못하는 미안함이 일하는 엄마에게 늘 있다.
내가 내 아이를 키우며 느낀 감정을 학부모도 느끼고 있을 거다. 나와 같은 마음을 느낀다는 걸 알기에 더 부모 편에, 아이 편에 설 수 있다. 때론 서운하고 속상하고 억울해도, 아이의 엄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길 스스로에게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