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Q , 지금부터 Q] 1. 당신이 가져야할 7가지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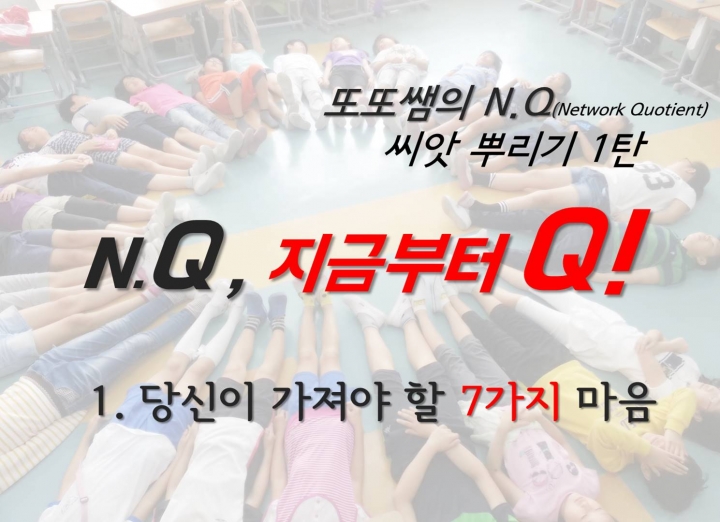
이 프로를 보면서 가끔 나는 교사를 떠올린다. 요즘 세상에 교사야 말로 슈퍼맨이 되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창의적이고 빼어난 수업 기법은 기본이며 학생들의 인성도 잘 함양시켜야 한다. 거기다 매년 아메바처럼 번식하는 행정 업무도 완벽하게 해내야 하며 학부모나 사회를 대상으로 한 관계 유지도 잘 해야 하고, 그리고는 각자의 가정에서 또 돌아온 슈퍼맨이 되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의욕적인 교사는 이것저것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게 되고 공부할수록 더 모르는 게 많다는 걸 강하게 인지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러다 결국 손을 놓게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번 시즌 에듀콜라 연재는 한 가지 주제로만 하려고 한다. 화려한 학급 살이, 수업은 제쳐두고 하나에만 관심을 가져보자. 워렌 버핏이 그랬다. 원하는 것 하나만 쥐고 나머지는 눈길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그 주제는 바로 ‘N.Q 씨앗 뿌리기’다. N.Q는 Network Quotient, 즉 관계 능력 지수를 의미한다.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인데 거창해 보이지만 교실에서 강조되고 있고 필요로 하는 것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슈퍼맨이 될 수도 없고 되기도 싫기에 학생 스스로가 망토를 두르고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그 중요한 씨앗이 N.Q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 시즌을 통틀어 연재할 예정인데 다음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섰으면 좋겠다.
[마음1 :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가장 어려운 마음으로 시작하려 한다. 교실에는 어른인 교사와 아이인 학생들이 있다. 근대까지 교육이란 미성숙한 학생을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산업화 시대에 숙련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시대는 끝났기에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교사와 학생은 동등하다. 모든 게 공평해야 한다는 기계적 평등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동등하다고 말하고 있다. 동등하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말한다. 그렇기에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필자가 자주하는 비유인데 ‘학생들을 대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 오랜만에 놀러 온 친한 친구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인지 먼저 생각하자.’라고 한다. ‘아니, 경험도 부족하고 아직 미숙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기르는 게 교사의 의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방법들이 꽤 어렵게,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한 논쟁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마음2 : 진심이 없는 방법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많은 교육 기법, 프로그램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인디스쿨의 좋은 연수를 참여하거나 행복교실을 수행하거나 거꾸로 교실, P.D.C, 프레네, T.E.T 등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아, 이거 아이들에게 활용해보면 좋겠다.’그리고 거기에 깊어질수록 거기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다. 아무리 컨텐츠가 좋아도 ‘왜 하는가(why)’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그리고 그 ‘왜’가 교육적으로 아이들을 향해 있지 않다면 껍데기에 불과하다. 가끔 교감, 교장 선생님이 T.E.T강의를 들으실 때가 있다. 그럴 때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이거다.
“아, 선생님. 그럼 이런 방법으로 말하면 선생님들이 내 명령에 더 잘 따르겠군요?”
그럴 때면 참 허무해진다. 그 시간까지 이야기 한 철학적 기반, 컨텐츠의 목적은 깡그리 무시한 채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을 효과적으로 조종할 수 있을까?’에 핀트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혹시 교사도 그렇지 않을까? 교육적으로 어떤 걸 위해서 이걸 하는지는 잊은 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내 의도대로 조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몰두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마음3 : 방법 없는 진심은 외롭다.]
위와 정 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선생님들도 있다.
“지나치게 기술적으로만 학생들을 대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반문한다.
“선생님께서는 기술로만 활용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오.”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이 필요할까요?”
교사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착각을 한 가지 한다. 진심은 무조건 통한다는 것이다. 맞다. 진심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울리는 것은 없다. 하지만 그 진심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상대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부장적이고 무서웠던 아버지의 진심을 어른이 되고서야 깨닫고 감동하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감동적이지만 나는 반대한다. 그 긴 시간동안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진심을 몰라주는 자녀가 안타까웠을 테고 자녀는 자녀대로 무서운 아버지가 어렵지 않았을까? 지금의 감동이 긴 시간동안 누릴 수 있었을 관계적 행복을 보상해줄 수 있을까? 철문 뒤에 상대를 위한 막대한 돈을 쌓아두었다고 가정해보자. 문을 열어 보여주거나 그걸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상대가 그걸 스스로 알아서 행복해하고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는 게 합리적인가? 다시 말하지만 완벽한 컨텐츠를 제시하려는 게 아니다. 자신의 진심을 효과적으로, 평화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음4 : 모든 교실에 맞는 마스터 키는 없다.]
한 때 인디스쿨 연수를 참 많이 다녔었다. 선생님들의 마음과 열정이 묻어난 컨텐츠들은 나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다. 주말에 배우고 나면 나도 모르게 ‘당장 아이들에게 써 봐야지!’라는 다짐을 하게 된다. 그리고 부푼 마음으로 월요일에 학생들을 만난다.
“얘들아, 선생님이 주말에 새로 배워온 게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수학 하지 말고 이거 한 번 해볼까?”
“수학 안 해요? 우와! 좋아요!”
흐뭇한 마음으로 열심히 진행한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때, 연수에서 내가 참여하면서 받았던 감동, 효과를 오롯이 느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그 선생님과 그 교실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밥상의 김치를 서양 식탁에 올려 봐야 인상만 찌푸릴 뿐이다. 그래서 앞으로 소개될 컨텐츠들이 나에게 주었던 감동, 효과를 모든 교실에 줄 것이라는 건 착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재료를 던질 뿐이다. 라면을 사면 뒷면에 ‘맛있게 조리하는 법’이 나와 있지 않은가?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방법대로 먹지도 않고 먹는다고 맛있어하지도 않는다. 접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주체가 되어 마음껏 물어뜯고 자르고 붙이고 섞어 자신의 컨텐츠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마음5 : 그 누구도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올해 졸업시킨 아이들에게 해준 말이다. 중학교 때부터 이어진 오랜 철학적 고찰과 경험으로 내린 결론이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전지전능하다는 신조차 다른 사람을 바꾸지 못했는데 범부인 교사야 오죽 하랴? 그럼 도대체 교육이 왜 필요하냐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교육이 아이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 학생이 있다. 그 학생이 물을 마실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한다. 물의 가치를 알고 있는 교사가 억지로 먹여봐야 그 학생은 다음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 하지만 본인이 마시겠다고 선택하거나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신다. 그럼 교육이란 학생의 목을 마르게 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학생이 목이 마를 때 마실 수 있게 물을 준비해두는 것이다.
N.Q를 키우겠다지만 교사는 학생들의 N.Q를 키워주지 못한다. 하지만 N.Q의 가치를 느끼는 경험을 제공하고 성장하고자 할 때 유용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준으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자는 이야기이다. 그 길의 주인은 학생이며 존중해야 한다.
[마음6 : 느끼고 생각해야 행동한다.]
어법적으로 맞지 않는데 학생들에게 영어의 수동태적인 표현을 종종 사용한다. 가령 ‘너는 공부를 하고 있니, 공부 당하고 있니?’라는 식이다. 행동의 주체가 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인데 교육적 활동에 대한 기본이 되는 믿음 때문이다. 인간은 옳다고, 좋다고, 무섭다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느껴서 생각하고, 생각하니 행동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속적인 행동을 보장 하느냐 못하느냐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수업에서 동기유발을 강조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비판하는 사교육은‘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다. 느끼고 생각하는 건 모두 빼버렸다. 왜? 그건 돈을 낸 부모들이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정작 아이들은 안 하는데 말이다. 그런 껍데기가 되지 않으려 최대한 노력하려 한다. 획기적인 동기유발 수단이야 없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왜?’에 대한 이야기 없이 던지지 않으려 노력해야 한다.
[마음7 : 비우기 위해 채우는 것이다.]
최근 학년 초 학급 세우기가 광풍이다. 페이스북 등을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수많은 컨텐츠들이 교실을 뒤덮고 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기에도 황금의 2주가 벅차다는 느낌이다. 고백하자면 작년까지 나도 그랬다. 교과서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로 빡빡하게 채운 2주가 행복한 일 년을 보장한다고 믿었다. 사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몇 번 해보고서 느낄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