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 촉진제 12>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게 절약가들 때문이라고요?
8개월 된 아가들이 장미꽃으로 기어간다. 앙금앙금. 새빨갛고 보드라운 꽃잎을 만지고, 던져보고, 맛도 본다.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른다. 온 마음을 다해 장미와 노는 그때. 펑! 폭음이 터지고, 사이렌이 울린다. 아주 날카롭게! 아가들은 소리를 지르고 불안으로 혼비백산한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마룻바닥에 약한 전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절망적으로 울부짖고, 작은 몸은 팔딱거린다.
폭음과 사이렌, 그리고 흐르던 전기도 멈췄다. 아이들은 흐느꼈다. 아이들은 이제 꽃만 보면 겁에 질려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의 한 장면이다. 이 공상 세계에서는 모든 인간을 계층과 역할에 따라, 기질을 교정한다. 숨 막히게 잔인한 이 장면은, 하층 신분 계층 사람들이 꽃을 증오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
왜 꽃일까? 멋진 신세계의 독재자들은 왜 노동자들을 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걸까?
자연에 대한 사랑은 공장이 바삐 돌아가게 만들지는 못한다.
...
"우리는 대중이 시골을 증오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들이 시골에서 벌어지는 모든 운동 경기를 좋아하도록 유도한다. 그와 더불어 모든 시골 운동이 복잡한 기계 장비를 사용하게끔 신경을 쓴다. 그러면 운동경기를 즐기려고 그들은 교통수단뿐 아니라 생산된 제품들도 소비한다. 그래서 저렇게 전기 충격을 주는 것이다."
- 올더스 헉슬리, <멋진 신세계> 중
자연을 사랑하면 소비하지 않는다. 소비할 필요가 없다. 자연에 대한 불쾌함을 학습시키는 것이다.
놀이에도 '템빨'을 강조한다. 흙과 막대기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 그런데도 반드시 복잡한 장비를 갖춰 놀도록 한다. 왜냐하면 흙과 막대기에는 돈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는 1932년에 이 작품을 발표했다. 90년이 흘러도 독자들이 이 작품을 찾는 이유는 그의 예언이 거의 적중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소설 속처럼 아이들이 공장에서 태어나진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런 정보를 많이 들었다.
"귀농에 대한 환상 버려라."
"<리틀 포레스트>는 농촌 판타지에 불과하다."
돈만 주면 쌀과 신발을 쉽게 구하는 도시 삶이 늘어나면서, 적은 돈과 노동력으로 굴러가는 시골 삶에 대한 공포와 편견도 커졌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차림새는 세련된 것, 시골의 차림새는 촌스러운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설령, 패션의 관점에서 '세련'과 '촌스러움'이 맞다고 해도, 우리는 세련되지 않으면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일해서 번 돈으로 소비하는 도시적 감각만이 남을 뿐, 직접 몸을 움직여 집안일을 건사하고 먹거리를 자급하는 풍경을 낯설게 여긴다.
어른뿐일까?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은 골목에서 노는 법을 모른다. 대신 따로 마련된 놀이 공간과 장난감, 기구로만 논다. 돈을 주고 산 장난감만 '놀이의 재료'처럼 여겨지고, 유치원 등원 길에 떨어진 돌멩이는 '더러우니 만지지 말아야' 할 천덕꾸러기다.
우리는 자연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쓴다. <멋진 신세계>를 유지하기 위한 성실한 부속품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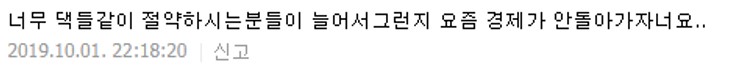
<사진: 오마이뉴스 '최소한의 소비' 연재 중, 기사에 달린 댓글>
누군가의 절약을 두고서 '댁들 때문에 경제가 안 산다'라고 말하는 것도 <멋진 신세계> 증상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때 유행처럼 번졌던 '소비가 미덕', '나의 과소비는 경제의 윤활유다'라는 자부심은 잘못됐다.
시장경제는 냉정하다.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물건이면 많이 팔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 불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는 자연도태되기 마련이다. 의무감으로 팔아주는 건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가 아니다. 자본주의라 부르기 민망한 것이다.
내가 텔레비전, 건조기나 식기 세척기, 무선 청소기를 사지 않는 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고급 자동차나 넓은 집, 키즈카페, 영유아 사교육도 마찬가지로 구태여 돈 주고 사야 되나 싶다.
외식비도 무척 비싸다. 똑같은 돈이면 유기농 재료로 집밥 해 먹을 수 있다. 그러니 집 앞 분식집 사장님께는 죄송하지만, 분식집 옆에 있는 유기농 매장에 가서 콩나물이랑 두부, 동물복지 유정란을 사서 집으로 온다. 된장국 끓이고, 계란 부쳐 먹는다.
대신 배움과 책, 꽃, 아주 휘겔리한 카페, 친환경 제품과 유기농 빵에는 지갑을 연다. 집 근처 식당 사장님들께는 죄송하기도 하지만, 한편 식당 옆 마트와 서점 사장님들과는 안면을 텄다. 멤버십 적립할 때, 이름도 묻지 않고 웃으면서 "최다혜 씨죠?" 하며 적립해주신다. 유기농 빵집 사장님도 "비닐봉지 안 드려도 되죠?" 하신다.
그러니 나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책, 꽃, 배움, 친환경, 유기농을 소비함으로써,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산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여긴다. 나는 나의 절약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

대중에게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삶을 유지하려면 온갖 물건과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직장에 나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온다. 그 돈으로 보통의 삶을 영위할 물건과 서비스를 산다. 아이들 장난감을 사고, 가사노동을 줄일 가전제품을 들인다.
하지만 그게 진짜 '나'의 선택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소비를 한 건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 별다른 고민 없이 갖고 있던 'Full HD 텔레비전'을 버리고 '요즘은 다들 UHD 텔레비전을 사니까'라며, 최신형 가전제품으로 바꿨던 건 아닐까?
자유의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멋진 신세계> 속에 살고 있는지는 '오늘 산 물건'을 점검해보자. '주말에는 당연히 가족 외식으로 단란한 시간을 보내야지'란 생각으로 다 끓여둔 어묵탕 놔두고 칼국수 집에 갔다면? <멋진 신세계> 속에 살고 있을 확률이 크다.
자연을 사랑하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 삶의 즐거움을 '템빨'에 의존하지 않으면 소비는 줄어든다. 어떻게 살 지는 정해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