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학교를 그만두었나. -11- 프리렌서 임고생

짧지만 강렬했던 회사 생활을 뒤로 하고 다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야 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나니 2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하나는 공립 학교 발령을 위한 임용고시 였고, 나머지 하나는 사립 초등학교 취업 준비였다. 회사를 다니며 다시 교사를 준비하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 했다. 회사에도 큰 민폐일 것 같았고 교사 준비 과정도 망할 것 같았다. 그때 쯤 회사 또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계속 해서 방향을 모색하던 중이었다. 몸집이 크지 않으니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 벤처 회사의 큰 강점 중 하나였다.
회사 대표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끝에 나와, 당시 회사에 있던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함께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서울에서 함께 기차를 타고 대전까지 도착한 뒤 한 팀은 경부선을 선택하고 다른 한 팀은 호남선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어느 쪽의 여행지를 선택하든 각자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그 곳에서 경험하게 될 견문 또한 다르기에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회사가 앞으로 더더 성장하기를 바랐고, (실제로 많이 성공했다. 가장 최근에 만났던 대표 오빠는 엄청 좋은 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회사 떠난 우리도 새로운 곳에서 또 다른 목표들을 이뤄가기를 바랐다.
회사를 떠나 교사를 다시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일상 생활을 고민해 보아야 했다. 직장 생활을 한 지 3년차였기에 돈을 벌어 생활하는 삶에 익숙해졌다. 당연히 부모님께 의지할 생각은 없었고 그 동안 모아 놓은 돈을 쓰기에는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았다.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 기간제를 해도 되었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기회가 왔다. 회사 생활을 통해 알게 된 기관에서 개인 교육을 부탁한 것이다. 이 교육은 회사 단위로 진행하기는 규모가 작았고 같은 주제의 교육을 여러 곳에서 1인 강사가 진행하기를 원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상황과 딱 맞아서 두 달 정도 해당 교육을 맡아서 진행하며 '프리렌서'의 생활을 잠깐 경험해볼 수 있었다. 교육 외에도 개별적으로 심사와 교육 기획을 부탁하는 곳이 있었고 말그대로 '건당 얼마'의 페이를 받으며 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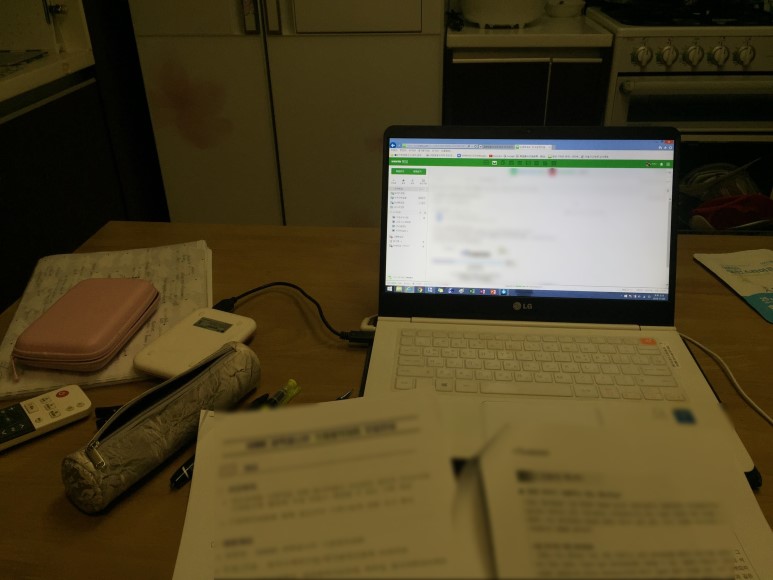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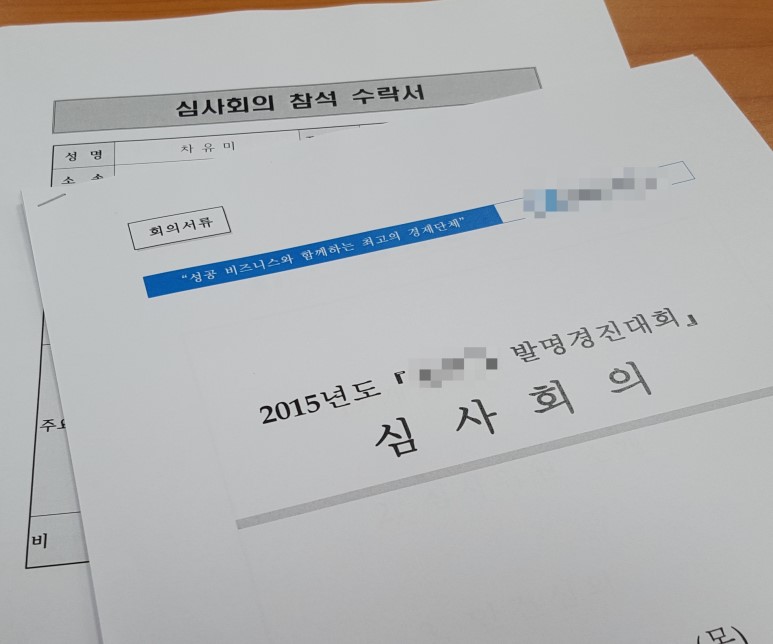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논의 했던 2015년 후반의 일들.)

담당자를 만나고, 교육 장소에서 직접 교육을 진행하는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은 다 나의 자유로운 시간이었다. 보통 오전에는 카페에서 일을 준비하고 밤, 새벽에는 임용고시를 공부했다. 오전에 카페에서 일할 때는 평생 이렇게만 살아도 좋겠다 싶을 만큼 여유로웠지만 저녁부터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바짝 집중해서 공부했다. 일을 하려다 공부를 하니, 공부가 힘든 것 보다 다시 수험생의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훨씬 힘들고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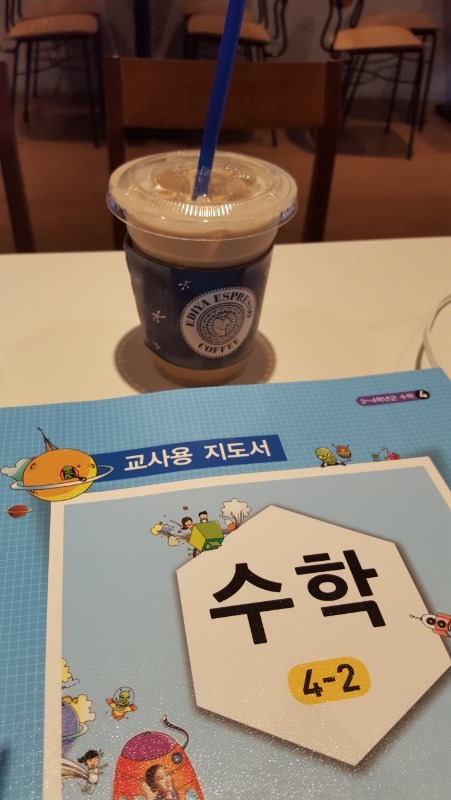
(일을 끝내고, 오후에 카페에서 나홀로 임고 준비하던 시절.)
저녁에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사립초등학교 채용도 알아보았다. 사립은 학교이긴 하지만 채용 형태는 1차 서류심사, 2차 수업실연 및 면접심사, 3차 이사장 면접으로 되어 마치 회사 채용 구조와 비슷했다. 매년 학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채용 공고를 내는 곳이 대부분이었는데 간혹 중간 채용 공고를 하는 사립초가 있었다. 주기적으로 전보하며 학교마다 다른 분위기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 없이 한 곳에서 꾸준히 교육 컨텐츠를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 사립초의 강점이라 생각되어 공고가 난 학교 한 곳에 원서를 넣었다.
내가 원서를 넣은 곳은 서류심사 다음으로 수업실연과 면접심사 2개의 단계로 채용 시험을 치뤘는데, 2차 결과 이후에 최종에서 불합격했다. 학교 현장으로 언제든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안일한 생각에 처음으로 충격이 왔다. 물론 실업에 대한 걱정도 함께이긴 했지만 그보다 학교에서 교사가 되는 것이 마냥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최종 불합격 했던 사립초등학교의 면접일)
학교를 박차고 나올 때는 다시 언제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막상 다시 준비하는 입장이 되니 교대 4학년 시절의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다. 임고생때 이 불안하고 갈피를 잡지 못할 공부는 다시는 못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2년 만에 무슨 확신에 차서 이 때의 마음을 잊었던 것일까. 자책도 참 많이 했던 시기였다. 한참 답답해지면 종종 이태원의 옥상을 찾았다. '아지트'라고 부르는 공간인데 초등학교 동창의 옥탑방 옥상이었다. 여기 흔들의자에 앉아 몇 시간이고 앉아서 멍 때리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학교로 돌아가도 될 것인가, 를 고민하곤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