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수업] 선생님 답이 진짜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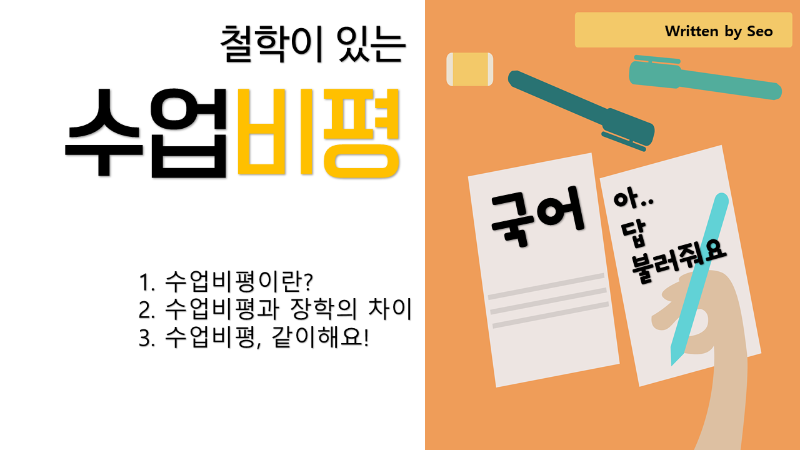
국어 교과서에는 해당 단원이나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재의 텍스트가 실려있다. 이 텍스트는 아이들이 읽고 탐구하고 생각해야 할 소재 거리이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교과서 속 텍스트는 정해진 모범답안을 찾기 위한 '지문'으로 추락해버렸다. 국어 시간은 이런 텍스트 속 정보를 찾는 물음에 가장 정확한 답을 찾아 써야 하는 '표면적 읽기' 시간이 되었다.
학원에서 늘 배우는 선행학습과, 배운 것을 평가해야 하는 지필평가 때문에 아이들은 국어책에 나와있는 수많은 물음이 단 1가지의 정확한 '모범 답안'이 있다고 믿는다. 이런 믿음을 심어준 것은 어른들이고, 더 자극적으로 말하자면 '교사'다. 교사는 시험이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항상 정답의 시비가 걸리지 않는 객관적인 문제를 만들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허용적인 문제의 출제를 기피했다.
초등학교는 그나마 사정이 낫다. 입시도 없고 초등에서의 평가 기준은 서열화를 위한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도 전체적인 면에서만 그런 것일 뿐, 중등과 고등으로 이어지는 입시를 일찍부터 준비하는 지역은 사교육 시장의 발달 수준부터 다르다.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일부 교사들도 국어책에 적힌 물음에 단 1가지의 모범답안을 불러주고, 이를 받아적게 한다. 나 또한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 나도 모르게 정확한 모범답안을 불러주는 나의 잘못된 교수법이 소름 끼치게 싫다.
내가 받은 그 소름끼치는 교육이 갑자기 생각난다. 어릴 적 담임 선생님께서 실물화상기 위에 실험관찰을 올려놓고 볼펜으로 답을 쓰던 장면이다.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고 딱,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3~4학년 때의 일이니 당연히 많은 부분을 까먹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왜 유독 그 실물화상기로 비쳐진 실험관찰 책이 내 머릿속에 남았을까. 늘 받아 적기에 바빴고 그 시간은 과학 시간이 아니라 보고 적는 '받아쓰기' 시간이 되었다. 나는 정답이 적기 싫어서 한참을 눈치보며 기다리다 선생님의 모범답안을 적었다. 내가 쓴 군더더기의 말보다, 깔끔하고 완성된 답을 적고 싶었기 때문이다.
국어수업의 대부분이 이런 과정을 거쳐 이뤄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교사의 모범답안 만을 기디라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 우리는 크게 소리치며 화내야 한다. 무엇이든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았던 교사의 자신과, 사유는 없고 자극만 넘치는 매체 속에서 생각을 잃어버린 아이들에 대한 화다. "내가 하는 말은 정답이 아니다. 너희들의 생각이 그 나름대로의 정리고 답이다.
그래도 아이들은 교사의 답을 기다린다. 자기보다 더 나은 어른의 표현력을 배우고 싶을지도 모른다는 비겁한 합리화가 꿈틀댈 쯤, 학습을 지도한 교사와 스스로의 사고력을 지니길 바라는 학생 사이에 모종의 학습 전략이 탄생되어야만 합리화로 둔갑된 내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선생님의 답을 듣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붉은색 펜으로 보충해서 적어라. 대신 너의 생각이 담긴 답변은 절대 지우지 마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아예 답도 안 쓰고 선생님이 불러주는 답만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 너희들 주위엔 ㅊㅅㅅ이 다가올 것이다." 나라가 어지러웠듬을 당시의 아이들도 느꼈다. 그래서인지 나의 분노어린 언중유골의 표현을 진지하게 듣는다. 나와 내 친구, 내 부모와 가족이 모두 위에서 언급했던 교육을 받고 자라왔다. 그래서 우리는 오바마에게, 우리에게만 주어졌던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벙어리처럼 있었을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