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남겨진 기분] - ep3 니 코때까리가 뭔지 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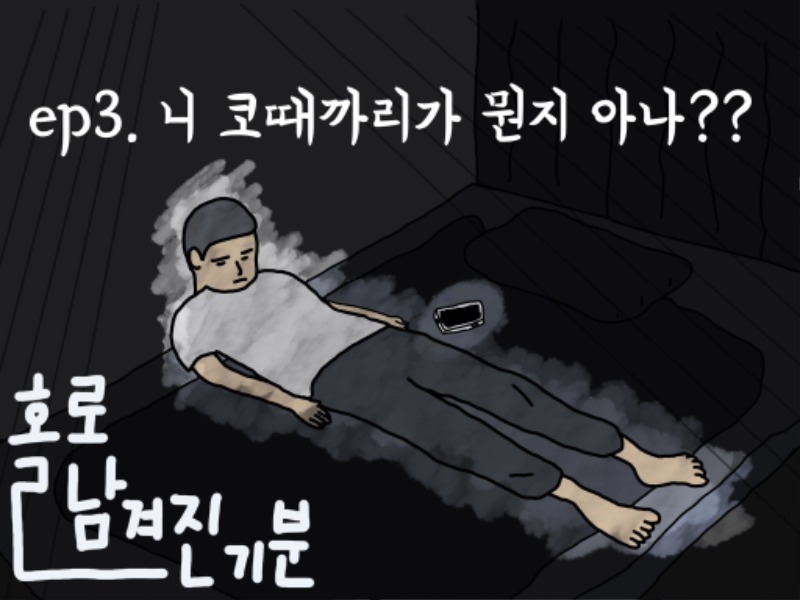
전학생이 왔다. 학기가 끝날 무렵 전학생은 적응이 쉽지가 않다. 새학기부터 만들어진 학급의 분위기가 있기에 전학생이 익숙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래집단도 이미 형성된 뒤라 아이가 홀로 남겨질지 아니면 어느 무리에 속할지도 걱정이다. 더러는 개성이 강한 학생이라 이미 굳어진 학급의 문화를 바꿔가는 경우도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교사의 입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쏟아야한다. 학급에서 필요한 것들도 알려줄 겸 아이의 적응에 도움이 될까 싶어 쉬는 시간에 짬을 내 학부모에게 전화를 한다. 부모를 안심 시킴과 동시에 선생님스러운 당부의 말도 잊지 않는다.
“아이에게 전학은 우리 어른들의 이민과 같은 느낌입니다. 화장실 위치, 책상의 모양, 주변 사람, 심지어 밥맛조차 달라지니까요.”
정작 아이에게는 다정하지 못했다.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기 보다는 스스로 적응하기를 바랬다. 친구관계라는 것이 어른들 마음대로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너, 얘랑 오늘부터 절친하도록!’이라고 해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아이들의 마음은 여름철 날씨처럼 한결같지가 않다. 그래서 더욱 스스로 적응하기를 바랬다.
유유상종이라고 본인과 잘 어울리는 학급의 무리를 찾아가서 빨리 자리 잡아주기를 바랬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 눈에 밉상이 되지 않도록 다정하게 챙겨주기를 꺼렸다. 첫날이라 표현은 못해도 긴장되고 불안할 텐데 괜한 주목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았다. 짧막한 소개를 해주고 필요한 물건을 챙겨주고 준비물을 전달했다. 아이의 경계심이 엿보였다. 시간이 해결해주리라 성급하게 다가가지 않기로 했다.
가을이 찾아올 무렵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서 또 다시 대구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 해동안 세 군대의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그리고 다시 대구로 말이다.
전학신고 하러가던 날이 기억난다. 창 밖에 아지랑이가 일어날 정도의 무더운 날씨였다.
긴장을 했는 지 호기심이었는지 창문을 내렸다. 얼굴에는 뜨거운 바람이 훅 들어왔다. 귓가에 알 수 없는 사투리가 들려왔다.
“촌놈들…” 영화속 주인공이나 된 마냥 혼잣말을 내 뱉었다. 이제 생각해보면 아주 겁 없는 한마디였다.
느즈막히 나는 교실로 들어갔다. 선생님은 무슨 공식인 마냥 말씀하셨다.
“자,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인사해 볼까요?”
“저는 경기도 00초등학교에서 전학 온 서성환입니다.”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나에 대한 관심인지 무관심에 나누는 잡담인지 헷갈렸다.
선생님이 지정해 주신 빈 자리에 앉고 어색하게 멀뚱거렸다.
그 때까지는 딱히 나에게 말 거는 친구는 없었다. 모든 것들이 어색했다.
숨이 턱 막히는 날씨, 어느나라 말인지 헷갈리는 거센 억양의 사투리,
책걸상의 디자인, 선생님의 말투, 내 삶은 마구 흔들어 놓은 서랍과 같이 혼란스러웠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고 종례 시간이 되었다.
준비물이 궁금했다. 아니 선생님의 말씀이 분명히 한국말인데 이상하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
선생님은 한번 더 공식인 마냥 "질문 있는 사람 이야기 해봐"라고 하셨다.
말씀이 떨어지자 마자 하루 종일 굳게 닫혀있던 입을 땠다.
“선, 생, 님”
이 한마디에 내가 그렇게 큰 무게로 다가올지 몰랐다.
교실에 있던 아이들이 모두 웃었다.
이름도 모르는 내 짝꿍은 물론이고, 처음 눈마주치는 건너편 아이도, 심지어 선생님 마저도 웃었다.
나는 이유도 모르게 웃음꺼리가 되어 있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귓가에 킥킥 거리는 웃음소리 사이로 아이들이 말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키키키 선생님이칸다”
“쌤보고 선생님~이칸다”
“선생뉘임~이지랄”
그렇게 선생님이 가시고 개구장이 아이들이 몇몇이 나를 둘러쌌다.
“니 코때까리가 뭔지 아나?”
(꼬때까리는 코딱지의 경상도 사투리였다.)
나는 알리가 없었다.
“전구지는 뭔지 아나?”
"낭창하다가 뭐이게?
어리둥절한 나의 반응이 웃긴지 아이들은 한마디씩 거들었다.
단어는 커녕 일본어인지 한국어인지도 구별이 안되었다.
아이들은 내 대답한마디에 격한 반응을 보여줬다.
깔깔깔 웃거나 따라했다.
그 날의 기억은 방과후까지 이어진다. 우리반 아이들은 나를 놀이터로 데리고 갔다.
썩 발걸음이 유쾌하지 않았지만 달리 선택권은 없었다. 놀이터 앞에 두 패거리로 나눠져 있었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A, 키는 작지만 땅땅하게 힘이 쎄보이는 B, 이 둘이 대장이었나 보다.
양쪽 패거리로 나눠어서 늘 그랬듯이 서로 욕설을 주고 받았다.
그리고는 그 불똥는 나에게 날아왔다.
“마, 니는 누구 핀할끼고?(너는 누구 편할거야?)”
나는 몸이 약해서 원래 싸움하고 거리가 멀었다.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그 꼴을 당했으니 선택은 물론이거니와 대답도 못했다.
그렇게 답답한 시간이 흘러갔다. 결국 아이들은 자기 갈 길을 가고 나만 덩그러니 어딘지도 모를 놀이터에 남았다.
무엇인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어제와 오늘 단 하루가 지났을 뿐이다.
서류상으로는 내가 다니는 학교 이름과 반 번호가 바뀌었을 뿐이다. 내 자리가 바뀌었을 뿐이고 선생님이 달라졌을 뿐이다.
근데 내 마음은 너무나 달라졌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희망을 품었다.
전학 둘째 날 나는 그렇게 입을 닫았다. 교실에 그럴 듯한 친구도 없었거니와 누군가와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말을 하지 않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놀림을 받느니 그편이 나았다. 장난 꾸러기였던 나는 그렇게 내성적인 아이인 척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나를 쉽사리 떠나지 않았다. 그 날 이 후 교실에서의 내 존재감도 침묵했다.
그리고 셋째 날 나는 처음으로 학교가기가 무서웠다.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나의 말투는 바뀌지 않았다. 대구 이외에 타지역에서 생활한 것이 더 오래되었음에도 나의 말투는 변하지 않는다. 선생님이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최대한 표준어를 쓰고자 하지만 당황을 하거나 화가 나면 무의식적으로 사투리가 나온다.
나는 사람들이 모인자리에서 첫마디를 꺼내는 것을 두려워한다. 조금 친해지고 나서는 내숭이었다 컨셉이었다 놀리곤 한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웃으며 이 때 말을 못한 게 한이 되서 지금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말을 하곤 한다. 하지만 처음 만난 사람과 첫마디는 아직도 내게는 큰 두려움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