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Q, 지금부터 Q 번외편] 13. 도쌤은 바퀴벌레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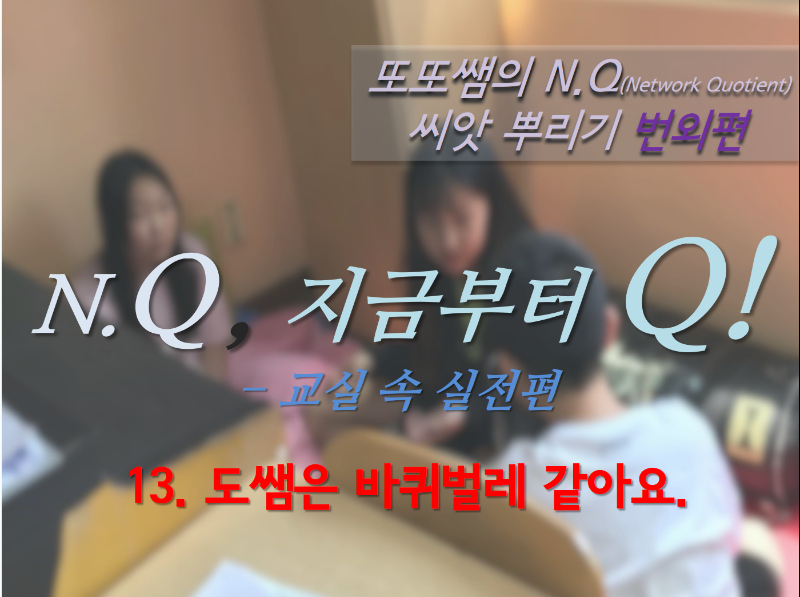
“혜빈아?”
“...... 네?”
나는 싱긋 웃으며 혜빈이를 바라봤다. 혜빈이는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내 천(川) 자 모양이 된 미간과 약간 벌어진 입, 한껏 올라간 광대가 그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오늘은 했어?”
“아, 진짜! 선생님~!”
마치 민망하고 난처한 질문이라도 받은 것처럼 혜빈이는 방방 뛰기 시작했다. 덩치도 커 이미 아가씨 같은 6학년 여학생이 급식실 앞에서 콩콩대는 모습은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안 했어요.”
“뭬야? 고~ 얀~ 것!”
나는 혼자 여인천하의 도지원으로 빙의해 눈을 옆으로 부라리며 혜빈이를 쳐다봤다. 여인천하를 알리 없는 혜빈이는 어이가 없는지 웃었다. 하지만 곧 혜빈이는 나의 헤드락에 걸렸다.
“한다고 약속했어, 안 했어? 앙?”
“아, 했어요, 했어요.”
“내일은 할 거지?”
“알았어요. 할게요, 할게요!”
나는 싱긋 웃으며 헤드락을 풀었다. 그리고 낑낑대며 키득거리는 혜빈이에게 더 활짝 웃으며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내일 만나자^^”
“아, 진짜~!”
혜빈이의 외마디 비명을 뒤로한 채 나는 급식실을 나섰다.
혜빈이는 사춘기를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녀석이다. 엄마가 학부모 상담 때 나에게 울면서 하소연한 내용들은 전형적인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이었다. 집에서는 말이 없고, 무뚝뚝하고,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짜증을 내는, 그래서 부모님의 속을 끓이는 녀석이었다. 특히 혜빈이 엄마가 나에게 특별하게 부탁한 것이 있다.
“선생님,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뭘까요 어머님?”
잠시 머뭇거린 혜빈 엄마는 한숨을 쉰 뒤 말을 이었다.
“혜빈이가 자기 아빠랑 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버님이랑요? 지금은 사이가 불편한가요?”
“혜빈이 아빠가 혜빈이를 엄청 아끼는데, 요즘 계속 부딪히면서 자기도 많이 섭섭한가 봐요. 이제는 말만 걸어도 짜증을 내니까……. 혜빈이 아빠도 언성이 높아지고. 아예 대화를 안 할 때도 많아요.”
“아……”
머릿속에 그려지는 장면이었다. 나는 호쾌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 번 해볼게요. 염려 마세요.”
“고맙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유심히 혜빈이를 살피고 돌아보니 몇 가지 단서가 보였다. 가족화를 그릴 때 따로 떨어져 있던 아빠 물고기, 어버이날 프로젝트 때 언급되지 않았던 아빠. 나는 관찰과 접근을 시작했다.
“혜빈아, 선생님이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
“뭔데요?”
“혜빈이 아빠랑 친하니?”
“아뇨.”
예상보다 무미건조하고 신속한 대답이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몰라요.”
사춘기 학생들의 전용 무기, ‘몰라요’가 나왔다.
“그렇지, 니 마음을 너도 모를 때야. 그럼 선생님이 알아봐도 될까?”
“아, 왜요~”
“왜긴, 선생님도 딸 가진 아빠인데 나중에 우리 딸내미한테 상처 받기 싫어서 연습하는 거야.”
“에에에?”
그렇게 나의 무기인 ‘던지기’가 시작됐다. 매일 혜빈이를 만날 때마다 나의 던지기가 날아들었다.
“혜빈~쓰~!”
“네에?”
“어제 선생님이 부탁, 아니 강요한 거 해봤어?”
“뭐요?”
“뭐긴, 아빠한테 ‘아빠, 오늘 회사에서 뭐했어요?’라고 물어보기로 했잖아.”
“아, 아뇨.”
나는 일부러 오버하기 시작했다.
“뭐~라~고~? 안 했다고?! 어쩜 그럴 수 있냐!”
“아, 아니! 억지로 시키신 거잖아요.”
“응, 맞아. 강요야.”
쿨한 나의 인정에 혜빈이는 황당한 표정이었다.
“그래도 해줘. 야, 아빠는 딸내미가 뭐 하나 물어봐주면 얼마나 기분 좋은 지 아냐?”
“우리 아빠는 안 그럴걸요?”
“얼씨구? 아니거든? 어색해서 그렇지 엄청 좋아하실 거거든?”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도 아빠잖아.”
“하아……”
“오늘은 할 거지?”
“아, 알았어요.”
“고마워. 내일 또 물어볼 거야^^”
“네, 네, 네~”
나의 ‘던지기’는 매일 이어졌다. 가볍게, 장난스럽게, 스킨십을 섞어서, 하지만 집요했고 끈질겼다. 그렇다고 내가 무작정 밀어붙인 것은 아니다. 가끔 톤을 바꿔서 진지하게 질문하기도 했고, 나의 경험을 말로 풀기도 했다. 나도 끈질겼지만, 혜빈이도 참 끈질겼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주말 나누기 시간이었다. 프리즘 카드를 하나 골라 본인의 주말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혜빈이가 고른 카드는 터널 끝에 여명이 보이는 카드였다.
“제가 이 카드를 고른 이유는…… 아빠 때문입니다.”
아빠라는 단어에 나도 모르게 자세가 돌아갔다. 잠시 잠깐의 뜸이 초조할 만큼 관심이 쏟아졌다.
“빛이 살짝 보였거든요.”
“오~”
뭔지도 모르는 남학생들이 추임새를 넣었고, 나는 뜨거운 박수를 쳤다. 그리고 주말 나누기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혜빈이를 따라갔다. 그리고 말도 없이 바로 헤드락을 걸었다.
“아, 깜짝이야!”
나는 최대한 담백하고 멋진 목소리로 물었다.
“아까 이야기 물어봐도 돼?”
“음……”
기다렸다.
“곤란해요.”
아쉬웠다. 하지만 존중해야 했다.
“그래, 알았어. 니가 준비되면 이야기해주라.”
그렇게 쿨한 모습으로 헤드락을 푼 채 걸어갔다. 그때 등 뒤에서 혜빈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
나는 돌아봤다.
“...... 했어요.”
나는 대답 대신 빙긋 미소를 지었다. 능청 떨 때 보여주던 해맑음이 아니라 진하고 두터운 고마움의 미소였다. 그리고 엄지를 치켜세워 혜빈이에게 보여줬다.
“어려웠을 텐데, 고맙다.”
그리고 손을 세차게 흔들며 내 갈 길을 갔다. 그 뒤로도 나의 던지기는 계속되었다. 물론 혜빈이의 대답은 변했지만……
드디어 졸업이 다가왔다. 졸업식날 혜빈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 왔다. 그리고 아빠의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었다. 얼굴은 퉁명스러웠고, 말투는 툴툴댔지만 팔짱은 풀지 않았다. 녀석들을 보내고 나의 롤링 페이퍼를 보았다. 졸업을 맞아 모두에게 돌아가며 한 마디 씩 쓴 롤링 페이퍼였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도쌤은 바퀴벌레 같아요. 쫓아내도 옆에 있고, 쫓아내도 옆에 있고. 제가 뭘 잘못할 수 없게 만들어요. 고맙습니다.’
교사가 대화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실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학생들과 대화를 능숙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시작이 어렵다. 시작은 완벽히 타인 대 타인에서 연결을 만들어내는 위험하고, 중대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밝고 나에게 호감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상대가 사춘기를 겪는 고학년이라거나, 무뚝뚝하고 까칠한 녀석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단순히 친절만으로는 연결의 시작을 능숙하게 하기 어렵다. 그 과정에서 학생의 냉랭한 반응 때문에 교사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심하면 연결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던지기’다. 말 그대로 상대에게 툭 던지는 것이다. 가볍게, 진지하지 않게, 그러나 거부하기 어렵게. 던지기를 잘하면 철옹성 같은 상대의 벽에도 점차 금이 간다. 마치 복싱이나 격투기를 할 때 가벼운 잽을 상대에게 날리는 것과 흡사하다. 그리고 상대의 반응을 보며 대응하면 된다. 이 잽이 다운을 빼앗지는 못하지만, 계속 쌓이면 상대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주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 말이나 던지면 안 된다. 던지기를 잘하는 요령은 분명히 있다.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던져도 좋고, 상대의 성격이나 정체성과 반대되는(이질적인) 접근도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상대가 진지하다면 웃기는 말로 던지기를 하고, 상대가 까칠하다면 오히려 닭살 돋을 만큼 능청스럽고 친절하게 다가가는 식이다. 그래야 상대로 하여금 긍정이든 부정이든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고, 그 순간부터 벽에는 금이 가기 시작한다. 이때 상대의 호응을 얻으려고 너무 상대에게 끌려가며 던지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흔히 말하는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교사는 학생과 공감대를 나누는 ‘친구 같은’ 교사이지, 친구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던지기를 잘하는 가장 큰 조건은 ‘타고나는 것’이다. 센스라고 퉁쳐도 좋을 이 감각은 선천적으로, 혹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지게 된다. 어떤 말을 어떻게, 어디서 던지면 상대의 반응이 나올지 본능적으로 안다. 그리고 위험한 선은 넘지 않는다. 그러나 센스와 별개로 던지기의 힘을 강하게 하는 조건이 있다. 바로 끈질김이다. 한두 번의 시도에 굴하지 않고, 상대의 반응에 상처 받지 않으며 계속, 포기하지 않고 던지는 것이다. 그 끈질김 속에서 상대는 나의 진심을 읽게 되고, 그러면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긴다.
지금 우리 학급에서 가장 껄끄럽고, 가장 까칠한 녀석에게 ‘미친 척’하고 열 번만 던지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